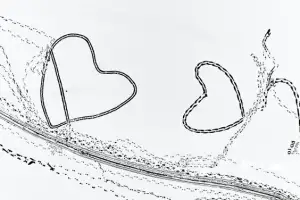이원화된 어정쩡한 훈련이 원인
수정 2009-07-29 00:52
입력 2009-07-29 00:00
가라앉은 기록 왜

노 감독은 200m 결선 진출에 실패한 뒤 “박태환이 전담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훈련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나이 선수들은 어느 정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수영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태릉(선수촌)에는 동료가 있다. 태환이가 합류하면서 팀 분위기도 좋았다.”면서 대표팀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전했다.
결국 그동안 어정쩡한 훈련 방식이 문제였다.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른 직후다. 노 감독과 모양새 좋지 않게 결별한 박태환은 이듬해 멜버른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 전담팀 감독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잡음 끝에 박태환은 지난해 초 다시 대표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지난해 10월 후원업체인 SK텔레콤에 의해 두 번째 ‘전담팀’이 출범됐다. 그런데 전담코치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박태환은 두 차례 미국 전지훈련을 하면서 데이브 살로(미국)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국내에 머물 때는 태릉에서 노 감독을 따랐다. 문제는 이원화된 훈련을 하면서도 대표팀-전담팀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또 전담팀은 자유형 1500m 기록 단축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 반면, 노 감독은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와 200m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며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박태환은 20세가 되기도 전에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정상에 올랐다. 따라서 전담팀이든 대표팀이든 관계자들은 사실 이번 대회를 큰 고비로 여겼다. 한 차례씩 목표를 이뤄 다음 목표가 사라진 때문이었다. 반면 주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보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꿈에 아나콘다가 나타났다.”는 등 심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 박태환은 2005년부터 쉴새 없이 달려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잡지사 취재진과 협찬의류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쉴 타이밍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끝난 건 아니다. 그에게는 2012년 런던올림픽이 남아 있으니 미리 ‘매’를 맞은 셈이다. 물밖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20세 청년에겐 과연 힘든 일일까.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9-07-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