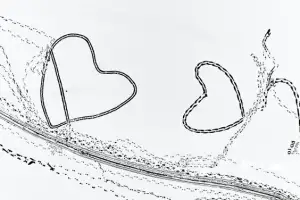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정윤수의 오버헤드킥] 대표팀 감독 빨리 뽑아 선수 살필 시간을 주자
수정 2007-09-27 00:00
입력 2007-09-27 00:00
두 번째 풍경. 지난 7월 동남아에서 아시안컵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숙적 일본을 꺾으며 3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승리한 팀의 핌 베어벡 감독은 사퇴했고, 패배한 일본의 이비차 오심 감독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표팀 감독이 여론에 따라 사퇴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역시 우리 축구의 오랜 풍경이다.
이 두 가지 풍경은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현재 축구협회는 추석 연휴를 마친 후 10월 초순에 좀 더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차기 감독의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감독 선임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현실이다.11월25일 남아공에서는 2010년 월드컵의 각 지역 예선 추첨이 이뤄진다. 이 무렵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그는 겨울 동안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개별 선수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6일 월드컵 2차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2월 중순에는 중국 충칭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꾸준히 전개되는 월드컵 지역 예선과 이에 대비한 평가전도 예정돼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늦어도 11월 중 선임될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의 뼈대가 되는 K-리그를 현장에서 직접 관전하면서 선수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신임 감독은 개별 기록과 동영상으로 선수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2차 예선을 거치면서 선수들을 확인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몇 발짝을 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만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는 못 한다. 감독 선임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기본 사항이 조금씩 늦어질수록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불어날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감독 선임, 그리고 대표팀 운영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축구평론가 prague@naver.com
2007-09-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