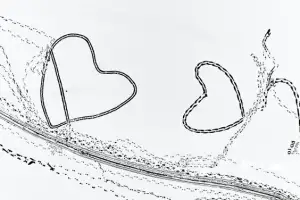儒林(743)-제6부 理氣互發說 제3장 君子有終(24)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제3장 君子有終(24)
꺼져가던 불길은 두향이가 저고리 깃을 집어넣자 한순간 다시 불꽃이 일고 이내 모든 것이 타올라 한줌의 재가 되었다.
두향은 타고 남은 재를 남한강의 푸른 물속에 집어넣었다. 노을이 비낀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고 한줌의 재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강물 속으로 어지러이 흩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더라.
서로 보고 한번 웃은 것 하늘이 허락한 것이었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봄날은 다 가려하는구나.”
20여 년 만에야 완성된 나으리의 전별시.
두향은 강선대 위에서 잠시 서편 하늘에서 타오르는 석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으리의 시를 소리내어 읊어보았다.
오래지 않아 두향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굴러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흩날리는 낙화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두향의 몸이 강물 속으로 내리꽂혔다.
전해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틀 후에야 두향의 시신이 강물 위로 떠올랐다고 한다. 나룻배를 젓는 뱃사공이 두향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초당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방안에는 짧은 유서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선대 위에 묻어주십시오.”
다음날인 3월21일.
마침내 퇴계의 유해는 건지산( 芝山)에 묻혔다.
이때의 기록이 퇴계선생연보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3월21일.
예안현(禮安縣) 건지산( 芝山) 남쪽 줄기 자좌(子坐) 오향(午向) 언덕에 장사지냈다. 장례에는 원근의 사대부와 유생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국장의 감역관(監役官)으로는 귀후서(歸厚署) 별좌(別坐) 김호수(金虎秀)가, 그리고 가정관(加定官)으로는 빙고(氷庫) 별좌 김취려(金就礪)와 예빈사(禮賓寺) 별좌 최덕수(崔德秀)가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장례의 제반사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퇴계의 장례를 치르던 날.
퇴계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매형에서 눈부신 매화가 피어났다. 원래 매화꽃은 동지로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여 81일째에 해당되는 대충 3월12일 무렵에 피어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퇴계의 장례가 끝나는, 그보다 열흘이 지난 계춘(季春)에야 뒤늦게 꽃이 피어난 것이었다.
그것도 어느 순간 한꺼번에 극채색의 아름다움을 폭발하여 단숨에 피어난 것이었다.
흰 매화꽃에서는 천진한 옥설의 방향(芳香)이 뿜어 나와 주인이 사라진 도산서당 안을 가득 채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2006-11-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