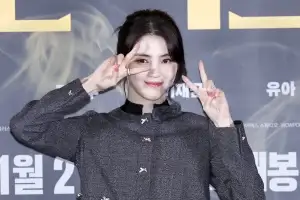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여담여담] 정몽주와 정몽헌/안미현 산업부 기자
수정 2004-12-25 10:53
입력 2004-12-25 00:00
개성시내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길목의 선죽교를 볼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돌다리에 ‘검붉은 자국’이 정말 있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언변이 터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려관(남한의 호텔)에서 건배 제의를 위해 일행 앞에 나선 도올은 “정몽주와 정몽헌이 참 닮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순간, 좌중은 조용해졌다. 개성공단을 돌아보며 누구나 한번쯤 떠올렸건만, 그러나 차마 입밖에는 꺼내지 못했던 고인의 얘기를 불쑥 꺼낸 것이다. 도올은 “우선 두사람의 성씨가 같고 이름에 몽자가 들어간 것도 같다.”고 설명하더니 “피를 흘리며 죽어간 것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 충신 정몽주는 500년 도읍 개성을 지키기 위해 선죽교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정몽헌 회장은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12층 현대그룹 사옥에서 몸을 던졌다. 죽음의 ‘성질’은 다르지만 “개성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간 것은 같다.”며 도올은 비통해 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현대그룹의 한 임원은 “개성공단 착공식때 정몽헌 회장님이 축사를 하셨었다.”며 “불과 1년후에 사모님(현정은 회장)이 준공식 축사를 하시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 TV를 켰다. 몇시간 전에 만세삼창과 함께 남한으로 떠나보낸 ‘개성냄비’ 400여세트가 15분만에 모두 팔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다음날 조간신문에는 무슨무슨 국회의원의 노동당 가입 문제가 여전히 어지럽게 지면을 메우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남과 북이 1일 경제권이 됐다며 축포를 터뜨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첨예하게 남과 북이 각을 세우며 이념논쟁을 벌이는 현실이, 정몽주와 정몽헌의 죽음만큼이나 연결되는 듯하면서도 잘 연결되지 않았다.
안미현 산업부 기자 hyun@seoul.co.kr
2004-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