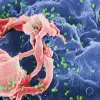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길섶에서] 기억의 처분/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18-11-11 23:39
입력 2018-11-11 22:08
참다 참다, 내 ‘유품의 생전 정리’를 핑계로 마지막까지 넘지 말아야 선으로 삼았던 케케묵은 편지와 연하장, 일기 등에 손을 대고야 만다. 수십 년간 소중히 보관해 온 기록과 사진을 가차없이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젊은 날의 치기가 새삼스럽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도 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건강하라’는 당부가 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잘 입지 않은 옷, 거들떠보지 않은 소품은 가급적 버린다. 기한은 정해놓은 게 없다.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30대 초반의 작가는 ‘2년’을 기한으로 삼았다. 안 좋은 기억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처분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8-11-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