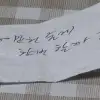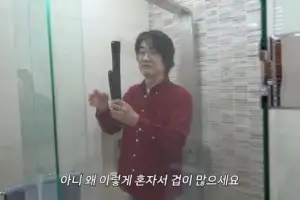[길섶에서] 피(血)/최용규 논설위원
최용규 기자
수정 2017-04-19 00:13
입력 2017-04-18 22:28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목을 과하게 쓴 탓일까. 10여년 전 후두에 달라붙은 못된 선수(癌)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를 버렸다. 지방에 출장 갔을 때 혼자 노래방을 찾아 부친의 ‘십팔번’인 ‘백마야 우지마라’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부른 적이 있다. 넘어갈 듯 숨이 차고 도무지 그 근처에도 이를 수 없는 초라함에 마이크를 놓아 버렸다. 머지않아 찾아올 운명의 그날 부친을 떠올리며 사부곡을 바치고 싶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 틈만 나면 이어폰 꽂고 노래 듣길 좋아하는 아들 녀석이 부친의 유전자를 받은 것 같다. 노래 실력은 모르겠지만?.
2017-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