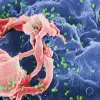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길섶에서]줄반장의 추억/구본영 논설위원
수정 2010-03-01 00:34
입력 2010-03-01 00:00
격월로 등산하거나 저녁 먹는 모임이지만 막상 끌고 나가기가 녹록지 않다.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아서인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모임을 알려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응답으로 마음을 쓰는 친구들이 여간 고맙지 않다.
문득 중학교 때 악동 친구가 생각났다. 그는 학급 임원을 맡자 몰라보게 헌신적으로 바뀌었다. 선생님과 급우들의 몇 마디 칭찬이 그렇게 만들었을 법하다. “어떤 사람이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해주면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한층 노력할 것”이란 명언이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았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0-03-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