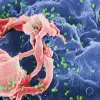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사설] 유통업계가 도와야 도로명주소 정착한다
수정 2015-02-03 18:01
입력 2015-02-03 17:54
새 주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보다 선진화한 주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와 일본만이 지번 주소를 써 왔다고 한다. 주요 도로에 세종대로 등의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가에 있는 주택과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표기해 도로만 따라가면 목적지를 쉽게 찾게 된다는 게 도입의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랜 관습 때문에 아직도 새 주소를 낯설어하는 게 현실이다. 집이나 직장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택배기사들도 찾기 쉬운 동(洞)과 아파트 이름, 지번 주소로 물품을 배달하는 실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과 논란이 다소 잦아들었다는 점은 발전된 모습이다.
새 주소 체계는 이왕에 시작한 것이다. 되돌리지 못할 거라면 정착을 서두르고 걸림돌을 줄여 가야 한다. 그동안 다소 느슨해진 캠페인 등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시행 초기보다 새 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있어 홍보 효과가 나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부촌 아파트에서는 배송업체가 새 주소를 적어 배송하면 “허락도 없이 주소를 바꿨느냐”며 항의한다고 한다. 협조는 못할망정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지번만을 사용 중인 토지대장 등 부동산 문서에 새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행자부가 유통업계에 도움을 요청한 데는 이들의 참여 없이는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유통업체에서 새 주소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유통업계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바란다.
2015-02-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