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그래도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김태균 경제정책부장
김태균 기자
수정 2016-09-29 18:42
입력 2016-09-29 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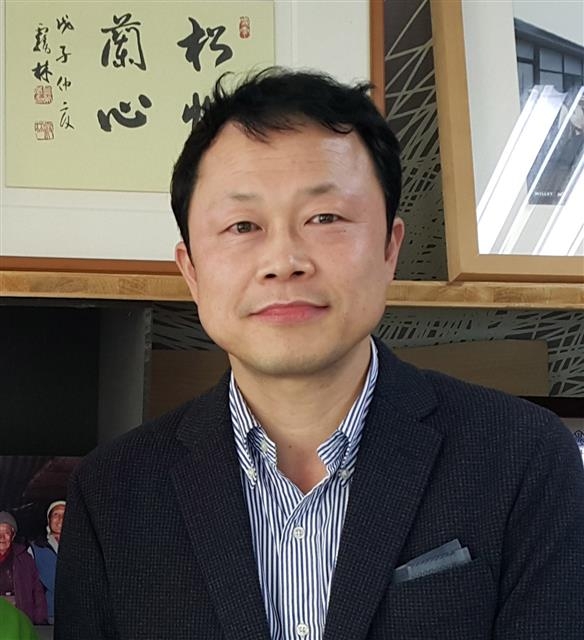
정책 당국자들이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사회 구성과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을 타고 실시간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현실에서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발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는 그런 면에서 더 크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못지않게 공무원 사회와 외부를 차단하는 두껍고 묵직한 칸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효 첫날 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경위야 어찌 됐던 우리 사회는 그 법이 안고 있는 여러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에 방점을 찍고 이를 선택했다. 김영란법 시스템은 이미 가동이 됐고 돌이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걱정만 하는 단계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다. 이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위축돼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영란법의 발효를 민과 관의 불투명하고 닫힌 만남을 투명하고 열린 만남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을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미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사회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을 만나 관심사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자는 주장 같은 것들이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조기 퇴근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혹은 담당자와 민원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걱정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소통의 대안을 고민할 때다.
windsea@seoul.co.kr
2016-09-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