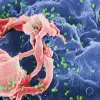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생명의 窓] 그녀들의 고민/하지현 건국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수정 2010-04-10 00:12
입력 2010-04-10 00:00

연극 속의 등장 인물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뭐가 부족하고 어려운 게 있다고 힘들어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보고, 혹은 그동안 각자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알고 나니 겉으로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아파트 융자도 다 갚았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은 뭐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덫에 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마치 유유히 호수 위에 떠 있는 우아한 백조가 사실은 떠 있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쉴 새 없이 발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이.
관객들의 고민도 등장 인물들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한쪽은 너무 부딪쳐서 문제, 다른 한쪽은 너무 순종적이라 문제였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두 어머니는 어찌 되었건 아슬아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었다. ‘누가 내 고민을 이해해 줄까?’
일상의 고민들이 자기 안에 맴돌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었다. 내 생각에 고민의 핵심은 ‘우리’는 있는데 ‘나’가 없다는 것이고, 진심어린 소통을 원하면서도 막상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 대한 즐거움, 성찰은 없었다. 남편과 자식이 잘돼야 내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 어느 순간 우리라는 틀 속에 있던 그들이 떠나고 나면, 혹은 투자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나면 빈껍데기만 남아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는 이해받고, 통할 소통의 방법도 잃어버렸다. 절망감은 깊어간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우울은 큰 사건을 경험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연극의 등장인물, 관객들의 고민이 그랬듯이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온 삶의 무게들이, 우리라는 책임감으로 얹어 놓은 부담들이 선을 넘으며 내 영혼을 주저앉혀 버린 것이다. 그러기 전에 짐을 덜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지워진 많은 부담을 내려놓고 나눠준다. 그 과정에 아무 말없이 묵묵히 가지 말고 소통을 해야 한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다시 떠나 보자.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2010-04-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