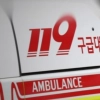[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미네르바 보석 기각 유감
수정 2009-03-18 01:08
입력 2009-03-18 00:00

미네르바는 많은 이의 환상을 깨우쳤다. 당초 예상과 달리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일한 적도 없었다. 공고와 전문대 출신이 전부였다. 인터넷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구속을 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비난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눈을 감았다.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박씨측이 청구한 보석을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박씨는 증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글을 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가짜 미네르바의 실체도 밝혀진 마당이다. 그렇다면 법률적 판단만 남은 셈이다. 보석을 허가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봤다. 모든 국민에게 표현 및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특히 학문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독일은 일찍이 1850년 프로이센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를 별도로 정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5조 3항은 “예술 및 학문, 연구 및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의 기고를 학문으로 볼 수는 없을까. 그가 만약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현직 교수·연구원 등으로 있더라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까. 허위사실만을 뚝 떼어 처벌하는 것이 능사일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영 떨칠 수 없다. 그래서 공판이 더욱 주목된다.
오풍연 대기자 poongynn@seoul.co.kr
2009-03-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김정은 “특별한 선물”…아빠 옆에서 저격소총 쏘는 김주애 [포착]](http://img.seoul.co.kr/img/upload/2026/02/28/SSC_20260228094816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