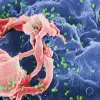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씨줄날줄] ‘같은 까마귀’/황진선 논설위원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하지만 최근엔 까치가 천덕꾸러기가 됐다. 까치의 산란기인 봄철만 되면 한국전력은 전신주의 까치 둥지를 철거하느라 ‘전쟁’을 벌인다. 가을철엔 농촌의 자치단체들이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퇴출에 골머리를 앓는다. 반면 까마귀는 길조로 부활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선 진작부터 길조로 사랑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가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삼족오(三足烏·세발 달린 검은새)가 고대로부터 태양을 뜻하는 문화상징으로 쓰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인 것 같다. 쌍영총·무용총·각저총 등 고구려 고분벽화와 금동장식품엔 삼족오가 용과 봉황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돼 있다. 2006년 초에는 새 국새의 손잡이를 삼족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엔 학용품이나 장난감, TV 드라마, 놋그릇과 자개장의 문양, 각종 휘장 등의 캐릭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건평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노씨가 ‘사람을 보낼 테니 같은 까마귀니까 잘 좀 봐 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는 속담이 있다. 타향살이를 오래하다 보면 고향에서 온 것이라면 까마귀마저 반갑다는 말이라고 한다. ‘같은 까마귀’라는 표현이 독특하고 구체적이어서 노건평씨에겐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09-02-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