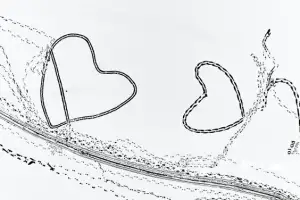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길섶에서] 땡볕과 그늘/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한 친구가 천호동 강가로 놀러가자는 제안을 했다. 같은 서울이었지만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이었다. 네댓명이 작당해서 집에도 알리지 않은 채 강으로 향했다. 삼각팬티 차림으로 얕은 물에서 장난칠 때는 좋았다. 헤엄을 잘 치는 친구를 따라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선 순간 바닥의 뻘이 다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코와 입으로 강물이 마구 들어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어른들이 달려 왔고, 구조된 나는 강둑에 눕혀졌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노래진 하늘색이 좀처럼 제 색깔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 아저씨가 가까운 자기 집으로 나를 데려 갔다. 땡볕과 그늘의 차이를 그때 확실히 알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그늘과 아저씨의 고마움이 다시 생각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6-08-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