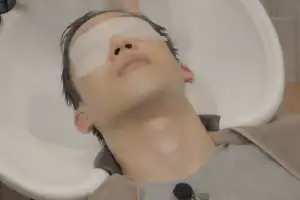[길섶에서] 혼례, 옛날식/ 심재억 문화부 차장
수정 2005-12-05 00:00
입력 2005-12-05 00:00
사모관대 신랑과 연지곤지 신부가 나서자, 마당을 채우고도 모자라 아이들은 까맣게 토담 위에 올라 앉습니다. 처음 하는 결혼식, 엉거주춤 서투른 신랑을 두고 동무들은 “첨엔 다 그래. 다음엔 잘하겠지.”라며 키득거립니다. 드디어 신부를 태운 가마가 대문을 나서자 코를 문대 소매 끝이 반질거리는 아이들, 약속처럼 비켜서 길을 엽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가마 앞을 막으면 징 맞고 동티 나 오래 못산다.”고 주절거립니다. 젊은 교꾼들은 “목이 말라 못가겠다.”는 너스레로 술을 청하고, 짧은 초겨울 해가 성큼 기울었습니다. 그 날, 가마 창 틈으로 반금이 누나와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쳐 짓까불던 제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얀 한지 너울에 싸인 신부의 꽃다발 속 붉은 동백에 마치 속살이라도 데인 것처럼.
심재억 문화부 차장 jeshim@seoul.co.kr
2005-12-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