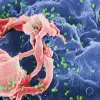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길섶에서] 업자의 뻥/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수정 2005-08-18 08:52
입력 2005-08-18 00:00
지난해 늦가을 녀석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나타났다. 마침내 큰 것 ‘한건’하게 됐단다. 이번 일만 잘되면 너희들 노후는 모두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다. 연말이면 결판이 난다더니 해가 넘어가자 설날, 그리고 눈 녹는 봄날로 미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5월 어느날 들뜬 목소리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소식을 알렸다. 두달 후 진전상황을 묻자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며 기다리란다.
며칠 전 통화 끝에 “야, 금방이라는 게 1년이 다 돼 간다.”라고 핀잔을 주자 “우리 마누라는 24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1년 가지고 그러냐.”며 너무도 당당하게 대꾸한다. 역시 사업이 적성인 것 같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8-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