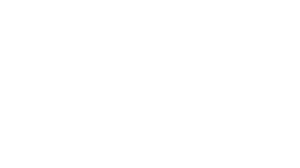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길섶에서] 절규
기자
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그러나 며칠전 이곳을 산책하다 부딪힌 한 남자의 모습은 그 숨고르기가 얼마나 큰 사치인가를 뼛속깊이 느끼게 했다.30대쯤으로 보인 그는 3층8각건물 황궁우가 마주보이는 돌난간에 기대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다.두 번쯤 그를 스쳐 경내를 돌다가 더이상 걷기를 멈춰야 했다.그가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이윽고 그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왔다.‘제발 인간답게 좀 살 수 있게 해 주세요.조상님,살려 주세요.” 절규였다.
원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까.그 절규가 하늘에 가 닿았을까.청계천에서,부안에서,상도동에서 나라가 온통 절규로 들끓고 있다.온전히 살아 있음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얼른 왔으면좋겠다.
신연숙 논설위원
2003-12-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