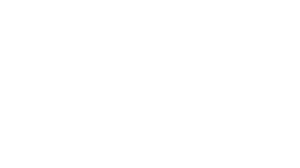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씨줄날줄] 논
기자
수정 2003-10-09 00:00
입력 2003-10-09 00:00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빈땅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논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리도 심고,콩도 심고,벼도 심지.그런데 너희들 알아.논들도 다 이름이 있어.그것도 아주 예쁜 이름말이야.논이 장구처럼 생겼으면 ‘장구배미’라고 하고,버선같이 생겼으면 ‘버선배미’라고 하고,자라를 닮았으면 ‘자라배미’라고 불러.”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지난해 펴낸 ‘논이야기-나는 둥근배미야’의 한 구절이다.그는 유치원까지 시골에서 자란 아들이 논의 물꼬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책에서 벼의 성장과정과 논에 사는 생물,품앗이와 두레 등 논과 농사,농경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논두렁을 걷는 농부들의 땀과 눈물을 받아 겨울 마당에 노란 벼들을 한바탕 쏟아놓는 논이 상을 받았다.환경단체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이 7일 제9회 풀꽃상 대상으로 ‘논’을 선정한 것.수천년간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논의 가치가 이제야 평가를 받았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마저 든다.지금 들녘에선 태풍 매미가 핥고 간 상처를 딛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도시인들도 일년에 한번쯤 가을 들판에 나아가 ‘경작의 오랜 역사 속에서 거대자본과 화학농법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고 생명이 담긴 벼농사를 지어온 이 땅의 모든 소농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 보면 어떨까.“사람들은 익어가는 들판의 곡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그러나 들판의 익어가는 곡식은 쓰라린 마음에 못을 박기도 한다.가난하게 굶주리며살다간 사람들 때문에….” 박경리가 대하소설 토지에서 지적했듯 가을 들판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풍요와 가난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인철 논설위원 ickim@
2003-10-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