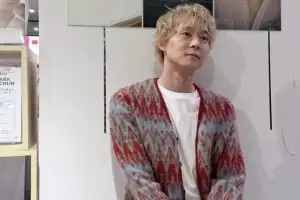인권, 강자의 면죄부인가
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커스틴 셀라스 지음 / 오승훈 옮김 은행나무 펴냄
흔히 인권은 인간의 문명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그러나 애초부터 천부인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인권은 개인의 자유에 눈뜨기 시작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이다.그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 제창된 1945년 유엔 창립회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계역사 속에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은 ‘세계인권선언’을 둘러싸고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넣기 위해 서슴없이 흥정을 하고 모략을 꾸몄다.‘세계인권의 심장’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출발부터 미국의 독무대였던 셈이다.인권위원회를 이끈 ‘인권의 대모’ 엘리너 루스벨트도 미국 국무부의 외교노선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던 철두철미한 냉전주의자였다.
전후 세계정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받아온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은 홀로코스트와 침략전쟁의 위법을 꾸짖었지만,드레스덴과 히로시마의 살육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인권,그 위선의 역사’(커스틴 셀라스 지음,오승훈 옮김,은행나무펴냄)는 이처럼 유엔의 창설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벌어진 두 전범재판에서 시작해 냉전과 탈냉전을 거쳐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그리고 테러와 복수로 점철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인권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런던에서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인권을 이용해 약자들을 제압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긴 강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할 때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경고한다.
인권이 정치에 놀아난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91년 걸프전을 앞두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병원 신생아실에 난입해 인큐베이터를 약탈해가는 바람에 수십 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떠벌렸다.미국의 무력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선전전이었다.역설적인 것은 이 헛소문을 퍼뜨린 주인공이 바로 평화와 양심의 상징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이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인권정책을 단순히 ‘정부사기극’으로 비난하지 않는다.오히려 오늘날 인권은 현대 정치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공용어(lingua franca)에 가깝다고 주장한다.“인권만큼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도덕적 호소력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더 강력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인권은 당분간 서방의 의제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라크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주권국가를 침략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한 미국의 위선조차 인권의 추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미국은 유엔헌장이 아니라 인권을 방패로 전쟁에 나섰다.그러나 인권은 헤게모니에 대한 야욕에 불타는 지도자의 광기를 치장하는 황금 면류관이 아니다.‘강자를 위한 윤리’가 돼서도 안된다.정치로 하여금 인권을 말하게 하지 말고,인권으로 하여금 인권을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1만 4000원.
김종면기자 jmkim@
2003-05-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