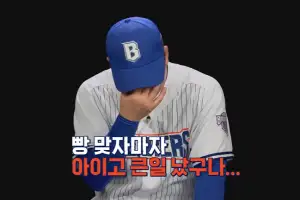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데스크 칼럼] 거꾸로 가는 서울대 교수사회
기자
수정 2002-04-15 00:00
입력 2002-04-15 00:00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정교수만 정년을 보장하고 부교수는 대학본부측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정년을보장하는 임용규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교수협의회측은 “정년 보장이라는 유인책을 없애고 계약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유능한 인력 유치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부교수의 경우 단과대별 일정 자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제 임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先) 신분보장-후(後) 능력검증’의 기준을 적용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이는 교수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이라며 그토록 반발했던 교수재임용 규정을 원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수협의회의 이같은 요구와 대학본부측의 ‘선 능력검증-후 신분보장’ 임용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불과 얼마전 발전산업 노조 파업사태 때 몇몇 서울대 교수들은 기고나 토론회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자유경쟁의 우월성을 역설하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측을 꾸짖었다.또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는 논리로 질타했다.
남의 밥그릇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밥그릇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내세워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꼴이다.
하지만 요즘 서울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하면 교수들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올해 졸업생 21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창의력에 대한 대학교육 기여도 등 17개 항목에서 ‘만족’(5점 만점 중 4점)을 넘어서는 항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울대 교육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높지 않았다.또 서울대생의 89%는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취업 준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퇴직한 교수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가 13.4%라는 사상 최고의 미등록률을 기록한 이유로 선단식 대학운영,교수들의 알력과 기득권 고수로 인한 구조조정 미흡을 꼽았다.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빙한 헨리로좁스키 전 미국 하버드대학 총장 등 해외자문단은 하버드대학에서는 초임교수의 30%만 정년을 보장받는 반면 서울대에서는 대부분의 초임교수들이 정년을 보장받는다며‘교수 평가장치의 보완’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자문단은 보고서에서 세계 수준에 가장 근접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90년부터 10년 동안 교수 1인당 발표 논문 수는 56편으로 도쿄대의 248편에 비해 22.6%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10년전 학부제 도입과 함께 정교수에 한해 정년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던 서울대의 노(老) 교수는 동료교수들로부터‘왕따’를 당한 끝에 미국에서 1년간 ‘유배’생활을 해야 했다.귀국 후 기자와 만났을 때 그는 미국에 있던 자신에게 성원의 편지를 보냈던 젊은 교수들이 교수사회의 주류를 이루면 권위에 비해 훨씬 기운 학문의 저울추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기대섞인 전망을 하곤 했다.
지금은 은퇴한 그 교수가 교수협의회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우득정 사회기획 팀장
2002-04-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