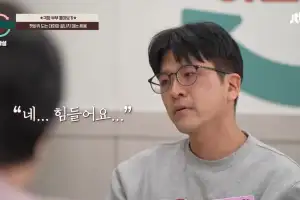[만나고 싶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이론가’ 최민씨
수정 2002-01-03 00:00
입력 2002-01-03 00:00
바쁜 일정 때문에 해를 넘겨 2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과거보다는 현재를 이야기하자”는 그의 말에는 운동경력을 팔아 정치권에 진입하는 일부 인사들의 변신에 대한 마뜩찮음이 묻어났다.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복지보다는 노동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노동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장애인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실질적 문제가 해결됩니다.일시적인 단순직 고용은 ‘깨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애써 묻어두려는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자 해묵은 기사를 보여주었다.박종철 의문사 와중인 87년 2월4일자 ‘左傾 ‘制憲議會’획책 24명 구속’이란 제목을 보고는 당시 조직총책이었던 그는 “정작 나는 못본 기사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장애 등 중고시절 삶의 의미를 못찾고 방황했는데 소설가가 되려고 들어온 대학에서학생운동과 만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긍정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며 “사명감이나 엘리티즘이아니라 ‘복음’으로서 시작했다”며 덧붙였다.
이후 무림·학림 논쟁,민민투·자민투 등 학생운동 노선을 둘러싼 숱한 논쟁을 주도하고 조직을 만들며 반독재민주 전선에 앞장서다 호헌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5공정권의탈출구로 희생양이 되었다.이른바 ‘제헌의회’사건으로 2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에도 시국사건 때마다 ‘배후’혐의로 쫓기곤 하다 유학을 결심했다.안기부 반대로 비자가 나오지 않다가 이수성 서울대총장과 백낙청교수가 신원보증으로 92년 6월 미국으로 유학간 일화는 운동권 및 대학사회에서 유명하다.
“미국에서 제가 국수주의자임을 절감했습니다.또 문제점도 많은 나라지만 헌법을 존중하면서 개인과 국가 영역을확연히 구분하는 관행이 부럽더군요.검찰이 제가 주도했다고 말한 ‘제헌의회’도헌법정신에 충실하고 그에 대한국민적 합의를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뉴욕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다 98년 귀국하면서 국제장애인연맹(MPI) 서울지부 회장으로 장애인 관련 일에 나섰다.장애인 DB구축 기업에서 일하다 고용까지 책임질 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과 함께 지난해 2월 ‘Data 구축과 장애인고용의 멋진 만남’을 모토로 ‘OPENSE’(www.
opense.com)를 창업했다.
2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그는 ‘80년대 이론가’답게 과거 운동권의 한계,정신노동의 중요성,인권,지역자치제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연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사회주의는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장애를 의식하고 사회의 어둠을 인식하게 된 어린 시절부터 ‘두 개의 적’과 싸워왔고,싸우고 있다.민주·평등사회와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앞에서 그의 가슴은 막막해지는 한편 한없이 뜨거워진다.
“제3의 섹터라 불리는 ‘사회적 기업’영역에서 장애인부문을 개척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제 삶을 바탕으로 ‘정치 에세이’등 몇 권의 책을 펴내고 싶습니다.”이종수기자 vielee@
2002-01-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