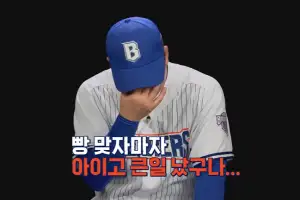北남편 만나는 안정순 할머니
기자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이제 새하얀 머리에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해버린 칠순의 할머니는 지긋이 눈을 감은 채 한맺힌 눈물만 쏟아냈다.
6·25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여름 시내에 나간다며 그길로 사라져버린 남편 김강현씨(78)와 상봉하게 된 안정순씨(75·서울 성동구 금호2가)는 26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자식들과 제사를 지내며 잊고 지냈는데…이제서야.”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8살 나이에 시집을 가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안씨는 둘째 아들 재혁씨(50)를 낳은지 석달만에 남편과 헤어졌다.군대를 제대한 남편를 따라 고향인 전북 거창을 등지고 서울로 상경했던 안씨에게 전쟁은 단란했던 가정을 빼앗고 인고의 세월만 남겼다.어린 두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평생 부정(父情)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다.
고혈압으로 몸이 불편한 안씨는 “살아 생전에 한번 만나봤으면 했지만 평생 꿈에서도 보이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다”면서 “오직 자식들이 버팀목이 돼 살아온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3월 이산가족 편지 교환 때 남편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안씨는 “남편을 만나면 평생 부르지 못했던 ‘여보’라는 말을 맘껏 불러보고 싶다”고 말하며 다시 눈물을 쏟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9-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