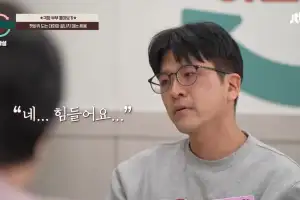[오늘의 눈] 제 역할 다 못하는 금융당국
기자
수정 2000-05-15 00:00
입력 2000-05-15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를 66조7,000억원(99년말 현재)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시장에서 정작 궁금해하는 개별 금융기관의부실 규모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직후 금융시장의불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들끓자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을 낱낱이발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은 잊어버린 듯하다.
한투·대투 문제도 마찬가지.5조5,000억원의 추가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즉각 발표하지 않았다.그대신 “공적자금 추가 투입 없이도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이 때문에 시장을 더욱 요동치게했다.
금감원이 감추는 것이 또 있다.4대 재벌의 지난해 구조조정 실적은 발표했으나 6대 이하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그룹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구조조정 현황은 지난달 점검을 모두 끝내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이후부터는묵묵부답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부실의 실상이 드러나면 부실 채권이 많은 금융기관의 예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이로 인해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렁이 담넘어 가듯’한 금융당국의 모호한 태도에 화답이라도 하듯 부실 금융기관들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명퇴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은 어디가 우량하고 부실한지를 알 권리가 있다.금융감독기관은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무서워해서도 안된다.좀더 확실한 시장안정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되는 금융의 ‘열린 행정’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박현갑 경제팀기자 eagleduo@
2000-05-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