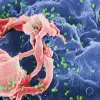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충무로 이단아’ 김기덕감독 새영화 섬
기자
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영화의 무대는 물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저수지 낚시터.낚시터를 운영하는‘말 없는’여자 희진(서정)은 낮에는 밥을,밤에는 몸을 팔며 살아간다.이곳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애인을 살해한 전직 경찰 현식(김유석)이 숨어든다.희진은 철사공예품을 만들며 소일하는 현식에게 점차 끌린다.그러던 어느날 검문나온 경찰에 놀란 현식은 낚시바늘을 입에 넣고 자살을 기도한다.
하지만 희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그들은 서로의 미끼에 걸려든 한 쌍의 물고기,상처입은 짐승과도 같다.그러니 그들 사이의 사랑은 강렬하고 야생적일 수밖에 없다.
영화는 끝내 낚시터라는 격리된 공간에 머문다.출구 없는 밑바닥 삶을 그려내기 위해서일까.감독은 섬 안에서,즉 출구없는 공간 안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철저히 드러내게 만든다.그리고 야속한 세상과 화해하게 한다.영화의마지막 장면은 남자가 여자의 자궁속으로 회귀한다는 의미에서 남녀화해를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적한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섬’은 잔잔한 수면 위에 떠있는 파스텔톤의 집,풀숲 사이로 노저어 다니는 작은 배 등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풍경으로가득하다.그러나 ‘섬’은 피가 흥건한 자해의 드라마이기도하다.영화에는낚시바늘을 삼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의식을 치르듯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무엇을 위한 자해요 섹스인가.감독은 진통제 같은 구실을 하는 섹스,그 다음에 오는 무집착·무소유 상태를 그리려 했다지만 과잉연출의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섬’은 4억3천만원의 제작비가 든 저예산영화다.기성의 제작 시스템 밖에서 게릴라처럼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이 처음으로 메이저영화사의 힘을 빌려만든 작품이다.그렇다고해서 그의 도전적인 작품정신이 손상받은 것은 아니다.그는 한국의 주류영화계에선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영화작가임에 틀림없다.
김종면기자 jmkim@
2000-04-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