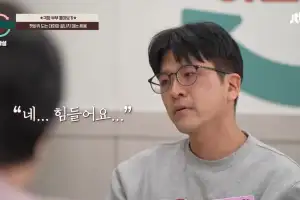리뷰/ 피나 바우시의 ‘카네이션’
기자
수정 2000-04-11 00:00
입력 2000-04-11 00:00
5일 오후8시 LG아트센터 상남홀에서 있은 부퍼탈 탄츠테아터의 ‘카네이션’공연은 개막을 알리는 신호없이 이렇게 시작됐다.
장면 하나.
1930∼40년대 풍의 블루스 ‘더 맨 아이 러브’가 흐르면 정장 입은 사내 하나가 마이크앞에서 열심히 율동(수화?)을 하며 따라부른다.노랫말처럼 ‘강한 남자’가 되고픈 열망이 그득하다.이어 많은 사내들이 여성의 속치마 바람으로 나와 네발로 무대를 뛰어다닌다.꽤나 흥겨운 분위기는 그러나,보타이를 맨 남자가 나타나면서 깨진다.사내들은 산지사방으로 달아나지만 결국 남자에게 잡힌 한 사내는 ‘나쁜 짓하다 아버지에게 들킨 아이’처럼 볼기를얻어맞는다.
장면 둘.
처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감자를 깎는다.그 앞에 구애자인 듯한 사내 너댓이나타난다.사내들은 차츰 처녀쪽으로 다가서지만 그들은 꽃을 건네거나 포옹하는 몸짓을 하지 않는다.처녀앞에 놓인 테이블에 올라가 높이 뛰어오르다결국은 굴러떨어질 뿐이다(남자다움의 과시일까?).사내들이 가까이 올수록처녀의 비명은 더욱 높아간다.
‘카네이션’에 등장하는 인간은 소외돼 있고 서로간 소통은 단절돼 있다.남자들은 억압을 벗어나 본능이 시키는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끊임없이 ‘강한 남자’를 요구받으며,일탈은 ‘볼기맞을 짓’에 불과하다.남녀관계로 대표되는 ‘단절’도 심각하다.남자는 거친 몸짓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그 때문에 여자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같은 주제는 형식에 어떻게 녹아들었을까?무대는 혼란스러울만치 자유분방했고 무용수들도 ‘큰 틀’안에서는 제맘대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리는 듯이보였다.또 관객을 향해 대사로써 직접 자기표현을 하곤 했다.그래서인지 ‘무용답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은 의외로 적었다.전체적으로 연극 쪽에 더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었다.
‘탄츠테아터’(무용극)라는 장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지난 79년 부퍼탈이 공연한 ‘봄의 제전’은 순수한 무용이었다.공연작품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느정도 ‘익숙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장르는 아직 국내팬에게 낯선 듯이 보였다.다만 작품이나 무용수 개인들이보여주는 자유분방함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덧붙일 것은 부퍼탈이 서울공연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점이다.무용수가 우리말로 대사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대부분 무리 없이 의미가 전달됐다.
이용원기자
2000-04-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