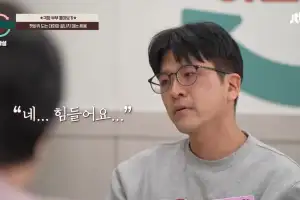미 남은 음식 싸가기 생활화
기자
수정 1997-07-14 00:00
입력 1997-07-14 00:00
‘간편하게 먹고 남은 음식은 싸가자’
음식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른 미국에서는 꽤 익숙한 현상이다.
지난 10일 낮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미국식 T식당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대고 있었다.여자손님들의 경우 사람 수대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보통 사람 수보다 1인분씩을 적게 시켰다.주문을 받아가는 여종업원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먹을 만큼의 음식을 주문하는 ‘요령’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한 ‘지혜’로 비쳐졌다.먹을만한 음식이 남으면 거리낌 없이 종업원을 불러 싸달라고 주문했으며 종업원도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미국식당에서 나오는 손님들의 손에는 남은 음식을 싼,‘도기 백(doggy bag)’이라는 누런 봉투가 들려 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
맨해튼 중심가의 한국식당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미국생활에 익숙한 교포들일수록 음식이 남으면 싸달라고 요청하지만 대부분은 언제 또 먹겠느냐는 식으로 그냥 간다는 것이다.
‘코리아 웨이’로 불리는 맨해튼 32가에 위치한 한식 대형식당에서 근무하는 이모양(21)은 “음식이 남아도 싸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로 보면 거의 틀림 없다”고 말하고 “음식이 남아 싸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다.이양은 미국사람들은 음식주문에 있어서도 체면보다는 실속을 중시한다면서 불고기를 시켜도 한꺼번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1인분씩을 추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사람들의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식사행태는 패스트 푸드 음식점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9일 낮 뉴저지 중남부 소도시 리빙스턴의 M 햄버거집에는 외식 나온 가족단위의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미국사람들의 주문은 햄버거 1개,콜라 같은 음료수 1컵,감자칩 1봉지가 고작이다.식사후 남은 것은 햄버거를 쌌던 종이와 종이 음료수 컵 정도다.어느 식탁이든지 남은 음식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사람들은 또 이른바 ‘테이크 아웃(takeout)’이라고 해 음식물을 싸 갖고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햄버거·피자 등 패스트 푸드 음식점에는 갖고 나갈 음식을 주문받는 카운터(픽업 카운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특히 바쁜 점심시간에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보다 ‘테이크 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패스트 푸드 음식점 주변에는 점심시간마다 자동차속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이들을 위해 거의 모든 음식점 한 귀퉁이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라고 표시돼 있다.바쁜 시간에 격식을 차려 먹겠다는 생각보다는 포장음식으로 차안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생각에서다.
한국식당이 미국식당에 비해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필요 없는 반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미국 음식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딸려 나오는 음식이 없는데 비해 한국 음식은 대부분 5∼6가지의 반찬이 따라 나온다.물기가 많은 것들이어서 남아도 싸갖고 나가기가 곤란하다.아직도 반찬이 많이 나오는 집이 인기가 있으며음식점은 손님의 취향과는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반찬을 내놓고 있다.
맨해튼과 가까워 저녁모임 손님이 많은 포트리 P식당의 주인 김모씨(67)씨는 “한국 음식문화는 ‘반찬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반찬이 많다 보니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젓가락이 한번도 가지 않은 반찬도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말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1997-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