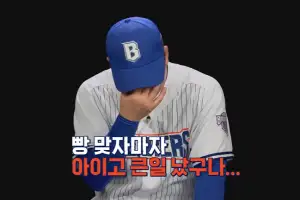시화 방조둑길 30리를 달려보고(박갑천 칼럼)
기자
수정 1995-04-12 00:00
입력 1995-04-12 00:00
출발점인 시흥군 군자면쪽에서 그 바닷길이 닿는 건너편의 옹진군 대부도쪽을 바라보니 날씨 탓인가,가물가물한다.그걸 이어낼 엄두를 어떻게 냈던 걸까.달리고 있는 길의 너비는 30m 정도이나 밑바닥은 1백여m.좌우로는 20m깊이를 말해주는 파란물결이 철썩인다.나라의 힘을 새삼 느낀다.
그리스신화에서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인지 아니면 토끼의 간을 욕심낸 「토끼전」의 용왕인지는 모르되 아무튼 바다의 주재자에게 냈던 도전장.그러나 그 바다의 통치자가 어디 호락호락한 존재던가.부어대는 흙은 말할 것 없고 트럭만한 바윗덩이를 갖다 메워도 물살의 힘으로 흘려버리는 심술을 부렸다.그렇대서 닻감을 수야 없는 일.홍로점설과도같은 역사는 계속되었다.우공이산이라 했던가.주변의 30여개 야산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그래서 바다의 신으로부터 받아낸 항복문서의 결과가 1,2단계합쳐 5천3백여만평(담수호까지는 7천8백여만평)땅이다.상전이 벽해된다 했지만 이건 벽해가 상전된 것 아닌가.
「삼국사기」 법흥왕 18년조에 『유사에게 명하여 둑을 보수케 했다』는 기록이 보이듯이 둑은 예로부터 농업과의 관계가 깊다.하건만 그 공사는 장비가 갖추인 오늘날 같을 수가 없다.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 전북 김제∼포교사이의 벽골제공사도 그랬다.서기 330년에 쌓았는데(「삼국사기」글해이사금 21년조)쌓을 때의 어려움이 전설로 내려온다.둑을 종일 쌓아놔도 이튿날이면 버력입은듯 무너져 있었다.공사가 터덕거릴밖에.어느날밤 공사책임자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뼈(마골)를 묻고 쌓아보라』는 것이었다.그렇게 했더니 무너지지 않았다.그 길이가 1천8백보였다.
그런 벼농사 위한 둑쌓기는 나중에 땅넓히기로 발전해온다.규모가 커지는만큼 어려움도 커진다.그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문제하며 환경문제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하지만 좁은 땅덩이,한정된 국토에서 효율적이용을 위해 택하지 않을 수 없는길.긍정적 시각위에서 대책을 세워나감이 옳을듯하다.
1995-04-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