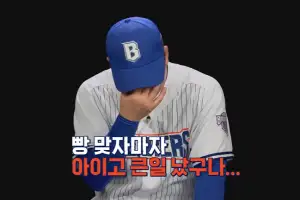한글 진료기록(외언내언)
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간암을 앓고 있던 30대 환자가 유명하다는 큰 병원서 입원치료하고 있을 때이다.식구들은 본인 의지로 이겨내도록 병명을 감춘채 기적을 바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다.그런데 환자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 환자가 집으로 내빼버렸다.가슴 수술자리가 아물기 전이다.집에 와서는 투약과 간호 모든 것을 마다하고 눈감고 회한에 잠겨 더욱 까부라졌다.결국 얼마못가 죽고 말았다.가족들이 두고두고 애통해한 것은 회진온 수련의 두명이 『말기암이라 희망없다』고 환자 옆에서 주고 받은 자기들끼리의 영어대화이다.이 환자는 일류대 독문학 전공인데다가 영어도 능통한 인재였다.곧 죽는다는 절망만없었어도 환자를 좀더 살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다.
의사들이 영어 쓸 때와 안쓸 때를 구별못한 예는 이 밖에도 많다.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이다.해방후 의학교육이 미국에서 입수된 영어교과서로 이루어졌고 병명 의학용어를 거의 우리말로 다듬을 사이없이 따르기 바빴다.선진의술 연수도 미국일변도로 치우쳐 국내서 한국의사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집담회도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예사였다.미국 갔다오고 영어쓰는 것이 의료실력인양 과시돼왔던것.
보사부가 드디어 진료기록을 한글로 적도록 의료법으로 규제한 것은 시원한 일이다.한국에서 한국사람 대상의 병력과 가족력,주요증상 진단결과,진료경과,예견,처치같은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과 소견등을 한글로 적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진료기록은 환자열람,타의료기관 이송요청에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더이상 의사들끼리의 암호문같이 짧은 영어로 적혀서는 안된다.
1994-06-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