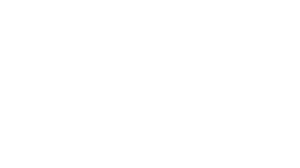소리꾼의 묘약/송혜진(굄돌)
기자
수정 1994-04-20 00:00
입력 1994-04-20 00:00
그 여류명창이 정용민명창께 사사하던 시절 스승은 제자들의 목이 걱정될 때면 이따금 이 약을 주었다.물론 이것은 그저 뒷간에서 아무렇게나 떠오는 것이 아니었다.스승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깨끗한 대나무를 베어다 농사에 쓸 거름을 만드는 인분 저장고에 담가 놓았다.며칠이 지나면 싱싱하고 촘촘한 대나무 결은 인분의 불순물을 모두 걸러내고 「묘약」을 흠뻑 빨아들이게 되는데,이쯤 되면 스승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일렬로 앉혔다.그리고는 가을 은행잎보다 더 샛노란 「묘약」을 소줏잔에 한잔씩 따르고,그 옆에는 입가심할 생강 한쪽을 놓아 주고는 혹 제자들이 이 귀한 「약」을 쏟아버리지나 않을까 회초리를 들고 제자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감독했다.물론 냄새나 맛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이 지독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명창 후보생들은 좋은 「소리」에 대한 일념으로 눈을 질끈 감고 초월해야만 했다.
어찌 이것이 단순히 「목」을 위해 나누어준 약이었을까? 추측컨대 노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 「묘약」마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소리 수업 이상의 의미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인생의 「희로애락애오욕」을 소리로 불러 청중들을 울리고 웃겨야 하는 판소리가 그저 「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고 보면 이 묘약은 혹독한 소리연습으로 상한 육체에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묘약」의 맛보다 더 쓰디쓴 소리인생을 극복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을 다스리는 약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국악원 학예연구사·음악평론가>
1994-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