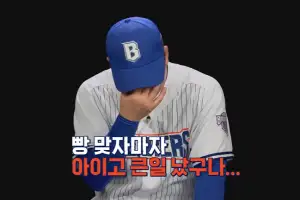고향/손정박 한국스포츠TV 감사(굄돌)
기자
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얼마전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변명삼아 또 그 얘길 꺼냈다.60년대초 대학시절로,50년대 중학시절까지.그러다가 기억 아슴아슴한 6·25전까지 이른다.이쯤 되면 교통이니 뭐 그런건 이미 염두에 없고 눈 가물가물 꿈같은 어린시절 더듬으며 마음 아릇아릇해진다.
그 친구 왈,『나는 고향을 잃었다.5대째 서울토배긴데,서울이 어디있어』물론 타임머신속에서 19 48년경의 서울 정경을 되살리며 하는 소리다.원래 수표교가 놓였던 그 근방 송사리 잡던 얘기며,뗏목 즐펀하던 왕십리 넘어 그 어느곳,수유리 연산군묘를 다녀 온 건 긴 여행이었다는 둥.
그렇다.시멘트 덩이에 덮여 사라진 청계천과 함께 그런 서울은 다시 없다.문득 전쟁통에 떠나게 된 내고향 춘천을 떠올리며 혼자 생각.나도 고향을 잃었을까,서울처럼 천지개벽하듯 바뀌진 않았는데.멱감고 물새 알 줍던 그곳이 의암호 수면 밑에 잠겨버리긴 했지만.
또 한곳,피란살이 정든 통영.
큰 가마솥 가득 무 숭숭 썰어 알배기 통대구국.
갯가로 튀어 올라 달빛 받아 허옇게 펄떡이던 멸치떼.
그런건 감자바위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우리에겐 곱고 애틋한 추억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아무때나 확인할 수 있는 형해로는 남아 있다.
비록 그 고향땅은 아닐지라도 마음따라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할머니 어머니가 묻혀 있다.
몇년전 추석때 시골 우리집에 불청객 여러명,북녘땅 두고 온 부모님들 제사 모시고 성묘갈 곳 따로 없어 무작정 왔단다.
그런분들께 우리의 헤설픈 고향타령은 얼마나 슬프고 음울한 넋두리일까.슬픔 더 담을 수도 없이 검게 탄 속,더 상할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괜한 얘기 꺼내 죄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고향땅 가까운 철조망 보이는 어느곳에 젖은 솜처럼 엎드려 억장 무너지고 또 무너져 삭정이 다 된 마음,울 기력마저 탈진된 당신들 곁에서 눈 욱질러 감고 마음 가득 눈물 채우며 손잡아 체온 나눌 수는 있다고.
1994-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