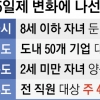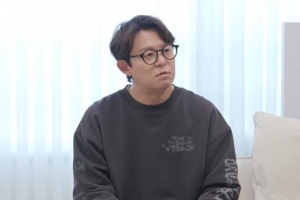[공직 대해부] 특채 출신 부처 국장 소회
수정 2010-12-20 00:22
입력 2010-12-20 00:00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유신사무관 출신의 한 국장은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답변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유신사무관 출신 공무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 사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그는 육사 36기로, 동기생 330명 가운데 33명 정도가 장군이 됐다. 그는 대위에서 소령 진급할 무렵, 자원했다. 선배들이 말렸지만, 시험을 준비해 특채됐다. 50명 가운데 해사, 공사 출신 각 3명씩 6명을 제외하고 44명이 육군에서 나왔다. 준비과정에서 낙방생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시험을 통해 공직사회로 진입한 만큼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행정고시는 아니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치른 승진시험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도 공무원사회에 특채제도를 통해 외부 인력을 수혈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불이익이 많았다. 당시만 해도 군인들의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에 각종 지원이 뒤따랐다. 월급도 당시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많았다. 그는 “처음 서울의 한 구청 과장으로 발령났을 때 집을 구할 수 없어 애를 먹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초기에는 박봉에 가족들의 고생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는 “군 출신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군 출신은 책임감이 강했고 리더십과 경험 면에서 앞섰다고 기억하고 있다. 군 생활 7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 물론 유신사무관 출신들의 15~20%는 공무원사회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에 어떻게 진입했느냐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자세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