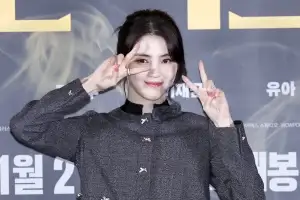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길섶에서] 석양보다 먼저/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수정 2022-11-11 00:40
입력 2022-11-10 20:18

싱거운 일 같지만 싱겁지 않다. 석양보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가로등이 없어서 붉은 저녁이 내려앉기 편한 곳. 옆구리에 논이든 밭이든 강이든 길게 감아도는 둑길쯤이어야 제격이다. 돌아올 차편, 어둠이 에워싸도 서둘지 않을 배짱. 챙길 것이 여럿이다.
도심 불빛에 놓치는 줄도 모르고 놓치는 것이 노을의 하늘이다. 어느 영화에서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오센티미터라기에. 수수밭 너머로 해가 떨어지는 속도를 나도 본 적 있다. 분속 수숫대 한 마디쯤.
유리창 너머로 온 저녁을 매달려도 도심의 석양은 알아볼 수가 없다. 해가 떨어지는 속도를 다시 재보고 와야겠다. 수숫대 사이로 꺼칠해진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박자박 내 발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칠흑의 밤이 이마에 잠길 때까지.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2022-11-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