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감춰야 했던 백색요원… 탈레반에 지불한 인질 몸값은?

손원천 기자
수정 2016-10-01 00:22
입력 2016-09-30 2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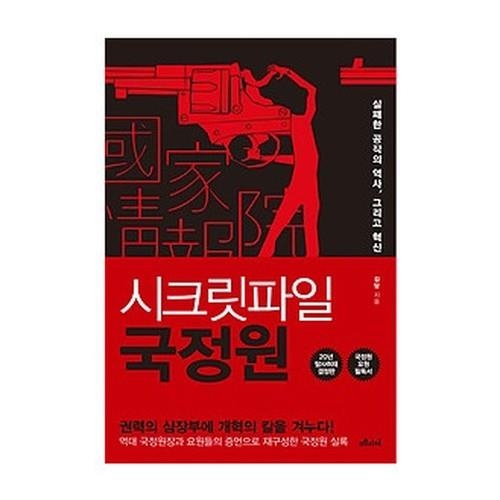
국정원 전문기자로 통하는 저자는 무턱대고 국정원을 매도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일들도 있고, 선진적인 개혁 과정도 거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도 순직하는 경우가 있을까. 물론 있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괴한의 총탄을 맞고 숨진 최덕근 영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그는 이른바 ‘백색요원’, 그러니까 외무부 직원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북한의 100달러 위조지폐 ‘슈퍼 노트’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년필 독침 흔적이 발견됐지만, 러시아 측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고 말았다.
책은 흥미로운 내용도 전한다. ‘테러조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깨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당시 탈레반에게 돈을 주고 인질을 돌려받았다. 당시 몸값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책은 2000만 달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당시 환율로 190억원쯤. 저자는 “먼저 풀려난 여성들을 제외하고 19명의 인질이 석방됐으니 1인당 10억원을 주고 풀려난 셈”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 가운데 지역 차별, 특히 호남 배제가 가장 심한 곳이 국정원이라는 속설도 사실임을 증명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국정원 간부 70여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불과 5명이었다. 정보 생산 부서의 처장급 간부 3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1명이었다. 아울러 책은 국정원 고위 간부의 고교, 대학, 출신지도 공개했다.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에 제공됐다는 행사비용, NLL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6-10-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