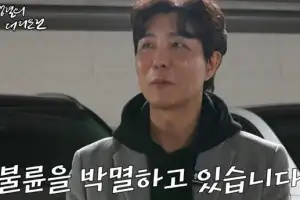앙금 씻고 ‘이라크 해법’ 찾을까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3자회동이 이뤄지면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으로 세 나라가 모여 이라크의 안정화 해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란은 시아파가 득세한 이라크 새 정부와 긴밀한 반면, 시리아는 수니파 저항세력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24년 전 시리아는 무슬림형제단의 폭동을 이라크가 사주한다고 비난했다. 그 뒤에도 국경 넘어 쿠르드족 분리운동을 막후 지원한다고 지청구한 바 있다. 미국의 침공 후 최고위급으로 19일 이라크를 찾은 왈리드 모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라크 안정화 회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복교가 성사되면 이라크는 수니파 저항세력을 설득하는 데 시리아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시리아로선 지난해 2월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에 연루된 이후 내몰린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잡게 된다고 영국 BBC는 분석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 파괴를 정강에 담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배척받고 있다. 아울러 1967년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골란고원 반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역내에서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아사드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이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우선 지구촌 최대 현안인 핵개발 의혹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의심을 돌리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전격 제의 배경이라고 BBC는 짚었다.
2003년 첫 핵개발 프로그램을 공표했을 때도 이란 관리들은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나 알카에다의 중재역을 제의했지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묵살당한 전력이 있다. 또 ‘악의 축’ 낙인을 제거하는 데도 이라크 중재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품고 있다.
그러나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그는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란은 이라크 저항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수니파에게 배척당하는 점도 이란의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이란과 시리아의 역내 패권 다툼으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11-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