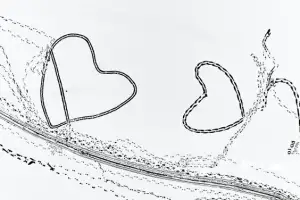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길섶에서] 꿈의 무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수정 2017-07-04 22:44
입력 2017-07-04 22:34
씨앗을 쏟아 일껏 세어 본다. 고작 찻숟가락 하나 채울 만한데 삼백 알은 더 된다. 상상은 빛의 속도로 달려 눈 깜짝할 새 당도하는 삼백 그루 편백의 숲!
덤으로 받은 씨앗에 단꿈을 꾼다. 편백 베개에 누우면 비늘 치듯 바람에 쓸려 오는 숲 소리. 뜻밖의 호사에는 마음 한구석에 짐도 쌓인다. 씨앗 속에 잠자는 울울창창 큰 나무들은 내 게으름을 날마다 나무란다. 무른 흙에 어서 묻어나 주지 뭘 꾸물대느냐고. 서랍의 씨앗 봉지는 볼 때마다 숙제다. 꿈을 꾸는 일은 그 몫의 짐을 감당하는 일.
여름 비에 모처럼 흙이 녹았다. 씨앗은 다 자란 나무보다 꿈이 더 깊어 등짐도 더 무겁겠지. 아파트 뒤뜰 볼품없는 흙자리에라도 씨앗을 묻어야겠다. 씨앗은 나무를 꿈꾸고, 나는 먼 숲을 꿈꾸고, 둘이 등짐은 나눠 지고.
2017-07-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