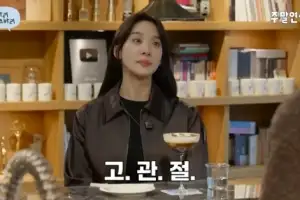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사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항 위해 기업들이 힘 보태길
수정 2015-07-24 00:43
입력 2015-07-23 23:06
혁신센터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처음 출범한 뒤 마무리되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센터는 17개 시·도의 한 곳씩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협업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세종센터를 제외한 15개 센터의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대기업들도 총수가 직접 챙기면서 혁신센터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75개 창업·중소기업에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75명을 신규 채용했고 171억 4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혁신센터가 존속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 사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서 알 수 있듯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정권사업’으로 그칠 수 있다. 관(官) 주도로 지역을 배분해 대기업에 하나씩 떠맡긴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적이어야 할 ‘창조경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른다는 사람이 무려 73.3%에 이르렀다.
혁신센터가 정권이 바뀌고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사업이 되려면 대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대적임은 물론이다. 또한 대기업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를 비롯한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로는 대기업들은 언젠가 발을 뺄 수도 있다. 이윤 창출이 기본 목적인 대기업이 언제까지 ‘수호천사’의 역할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장 성과를 내겠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혁신센터를 토대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2015-07-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