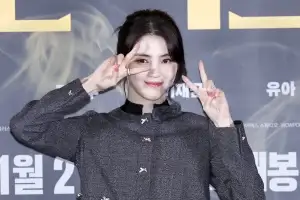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사설] 현대차 노사합의에 담긴 명과 암
수정 2012-09-01 00:00
입력 2012-09-01 00:00
노사가 근로여건 개선에 뜻을 같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대차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난해 연간 2040시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1749시간(2010년 기준)인 데 비하면 지나치게 많다. 이번에 근로자들에게 건강권과 여가시간을 돌려준 것은 회사 측의 배려가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일 것이다. 노사는 시간당 생산 대수를 30대 더 늘리고, 조회시간과 자투리시간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노동 강도가 강해질 테고, 벌써 노조 일각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현대차의 국내 생산성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울산에서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31시간이 걸리지만, 앨라배마에선 14시간이면 된다고 한다. 국내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해 수조원대의 손실을 빚고, 생산라인에 개입하는 일이 잦은 탓 아닌가. 이런 비효율을 없애 노동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임금 인상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비용을 해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한 현대차의 미래는 어둡다.
2012-09-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