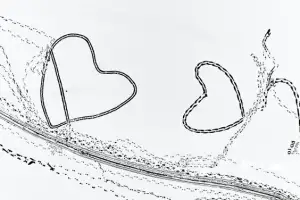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문화마당] 시인의 몸은 곧 시(詩)다/백가흠 소설가
수정 2013-05-23 00:00
입력 2013-05-23 00:00

서정주라는 역사가 있다. 그는 유일하게 완성된 시인이다. 모자란 시적 감수성으로 그의 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가 어떻게 변모되고 완성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시는 위대한 것이 사실이지만, 말의 비늘이 떨어져 나온 ‘시인의 몸’이 위대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시인의 ‘몸’이 없고 ‘말’만 있는 시인은 시인인가 아닌가. 시인의 몸이 가진 우주적 초월에는 실패한 것이 아닐는지.
최근에 한국시인협회에서 기획한 시집 ‘사람-시로 읽는 한국 근대인물사’(민음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시인이 되지 못하고, 부여받지 못한 숙명을 한탄하며 저잣거리 군상의 얘기나 다루는 소설가 나부랭이가 되어버린 필자의 감상이 뭐 대수로울까마는,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침울함이 크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논의의 대부분은 ‘누가,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논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숙명은 ‘왜’인가 하는 것이다.
참여한 시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이 시집이 ‘왜’ 만들어졌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시집 발간의 이유와 실체로 의심되는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몇몇은 ‘왜’ 이러한 논쟁이 생길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책을 발간해야만 했는지, ‘왜’ 시인이 시대적 소명을 모른 척하면서까지 논쟁의 중심에 서야만 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반대로 시집 출간이 시대적 소명이라 여긴다면 그것마저 뚜렷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닐까.
2013-05-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