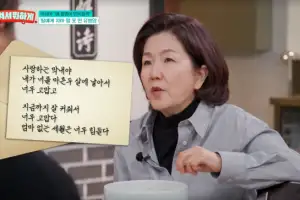[女談餘談] 몇 살이세요/강주리 정책뉴스부 기자
수정 2009-06-13 00:00
입력 2009-06-13 00:00

장·차관을 비롯해 연세 지긋한 ‘아버지뻘’ 취재원을 상대할 때 종종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나이, 학번,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띠.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아래 위를 굳이 구분 지으려는 노력은 눈물겹다. 조직 내 기수 서열이 엄해서 그런가.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이에 호소하거나 장유유서의 전통을 내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본다.
위아래를 따져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한국식 대화법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불편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같은 부처 출입 기자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아서일 수도, 상대적으로 여기자 수가 적은 데 대한 단순 호기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 “당신 몇 살?”이란 한마디가 주는 충격파는 꽤 오래 간다. 때론 ‘자신이 옳다.’라는 주장에 대한 확신과,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며칠 전 만난 한 동료 여기자는 “난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아니면 일하는 데 스트레스 받거든.”이라고 한다. ‘고무줄 나이’가 나름의 대처방식인 셈이다. 그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다고 한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우리사회에서 이 같은 항변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끔은 여성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공개하라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인품과 평판도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지혜롭게 ‘나잇값’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졌으면 한다.
강주리 정책뉴스부 기자 jurik@seoul.co.kr
2009-06-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