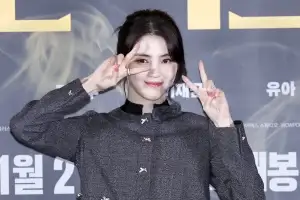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오늘의 눈] ‘국민’은 없는 ‘민의’의 전당/허백윤 정치부 기자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민주당 쪽 보좌관들이 지난 연말의 기억을 떠올렸다. 자정이 지나자 “한 달 전 대형으로 모여.”라는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상임위 회의실 앞에 의자로 바리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순식간에 대열을 갖추는 능숙한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한 보좌관은 “그때는 로텐더홀 돌바닥에서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는데 몸이 쑤셔 혼났다.”면서 “집권 여당이 되면 로텐더홀 바닥을 온돌로 바꾸자는 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씁쓸했다.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돌바닥에 드러눕지 않아도 몸 시린 서민이 많다는 걸, 선량(選良)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여권이, 말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툭 하면 ‘갈 데까지 가보자.’며 멱살잡이를 자초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속도전’의 대상은 민생이 아니라 야당이었던가. 여야가 정쟁의 대열을 갖추는 사이에 국회에는 2000건이 넘는 법안이 쌓여 있다. 일자리의 유지·창출과 교육·훈련 등 일자리 관련 법안도 20건이나 된다고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치와 국회에 한 가닥 기대를 걸던, 이름 없는 실업자와 서민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
국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허백윤 정치부 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2-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