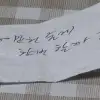[씨줄날줄] 3월 위기설/조명환 논설위원
수정 2009-02-17 01:32
입력 2009-02-17 00:00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은행의 외화 빚은 약 400억달러다. 이 중 약 100억달러가 3월 만기다. 국책은행의 외화 빚도 400억달러에 이른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어렵다. ‘3월 위기설’의 대체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3월 만기가 돌아오는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약 10억달러로 크지 않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회수할 필요도 없다. 시중 은행도 예대율이 높지만 연간으로는 흑자이다. 건전성 관리도 무난하다. 지정학적인 긴장감까지 가세하면서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우리의 외환보유액만 따지면 2000억달러가 넘고 세계 7위다. 그런데 왜 번번이 위기설에 휘말릴까. 적정 외환보유액과 맞닿아 있다. IMF가 인정한 가이드라인은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3개월분 수입대금으로 통용돼 왔다. 자금이 국경을 쉽게 들락거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재무차관을 지낸 파블로 기도티는 1999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 오는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단기자본 유출 예상액에 버금가는 보유액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합쳐 ‘기도티-그린스펀 룰’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유한 2000억달러가 단기 채무 상환에 넉넉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렇다고 단기채무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꼭 타당하지도 않다. 외환위기 때도 외채 만기연장비율이 32%였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보유액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달러도 양보다 질인가?
조명환 논설위원 river@seoul.co.kr
2009-02-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