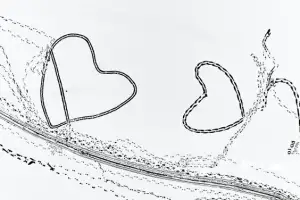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사설] 부실연구로 망신 자초한 서울대
수정 2007-04-14 00:00
입력 2007-04-14 00:00
교수가 자료를 팩스로 받은 것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밤이라고 한다. 일본 언론이 위안부 관련 네덜란드 법정 자료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날이다. 일본에 선수를 빼앗기자 부랴부랴 언론에 터뜨린 것이다. 그는 “17년간 연구하면서 이런 문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국내 자료를 제대로 챙기는 기본조차 잊은 것이다. 발표에 급급한 한건주의 타성에서 빚어진 일이다. 해당 교수의 불성실과 대학측의 검증 시스템 부재가 만든 합작품이다.
서울대는 황우석사태 이후로 연구성과를 공개할 때는 연구처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한 연구가 공표돼 대학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연구처에는 검증 기능이 없다. 늑대논문이 연구처를 통했으나 하자를 사전에 찾아낼 수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디를 통해 발표하건 연구의 1차적 책임은 학자에게 있다. 공명심에 불탄 학자들이 마구잡이로 부실 연구를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소홀히 한 서울대도 반성해야 한다. 더이상 망신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2007-04-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