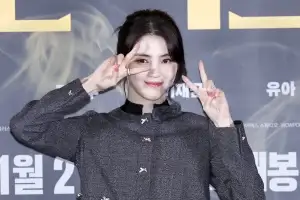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여담여담] 월드컵의 추억/이순녀 문화부 기자
수정 2006-02-25 00:00
입력 2006-02-25 00:00
서울로 돌아온 건 이듬해 9월말이다. 에누리없이 딱 1년을 채웠다. 맞다. 단군이래 한민족 최대 잔치였던 ‘2002 한·일월드컵’때 난 이곳에 없었다. 축구 애호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그때만 해도 스포츠 문외한이던 나는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것이다.
사실 영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축구라면 사족을 못쓰는 나라답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번에 “월드컵은 어쩌고?”라는 질문이 쏟아졌다.“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다.”는 솔직한 대답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곤 했다.
드디어 6월, 월드컵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평생 다시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역사적 현장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은 런던 중심가도 붉은 물결로 덮였지만 좀체 실감이 나지 않았다.BBC가 전하는 월드컵 소식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남들 다 가진 걸 나만 가지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서울로 돌아온 뒤 더 컸다. 연말이 다가오자 방송사들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편집한 월드컵 특집을 잇따라 내보냈고, 주위 사람들도 월드컵에 얽힌 화려한 무용담을 주고 받으며 동질감을 확인했다. 나도 타국에서의 응원담을 들려주며 대화에 끼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한·일월드컵’의 추억은 초라하고, 쓸쓸한 풍경으로 남을 것이다.
독일월드컵이 3개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도현밴드가 발표한 록버전 ‘애국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통신업체들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4년 전,‘오, 필승코리아’를 맘껏 외쳐보지 못한 나로선 이 얄궂은 논란이 더욱 씁쓸하다. 과정이야 어쨌든 하루 빨리 멋진 ‘국민 응원가’가 나오길 바란다. 나도 이제 화려한 월드컵의 추억을 갖고 싶다.
이순녀 문화부 기자 coral@seoul.co.kr
2006-0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