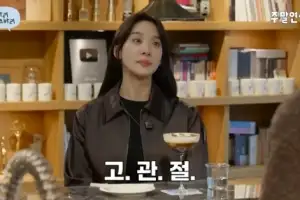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길섶에서] 눈 물/이춘규 도쿄특파원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순간 숨이 덜컥 막힌다. 눈자위가 뜨거워진다. 흰머리, 굽은 허리의 여든셋 어머니.“엄마, 아빠 울어요.”라고 아이가 걱정한다. 이게 아닌데…. 방으로 가서 눈물을 훔쳤다.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는 그리움이요, 눈물이리라.
지난해 여름 15개월만에 일시 귀국, 마음을 다잡고 마을어귀에 도착했다. 그리고 어머니.“어머니…”하고는 눈물만 나왔다.“충기야, 나도 안 우는디…”라며 중년의 아들을 달래주셨다.“너 돌아올 때까지 아프지도 못헝게, 마음놓고 있다 와라.” 하셨던 어머니다.
남자의 눈물은 입방아에 오른다. 태어나서 세번만 우는 게 사나이라던가. 최근 일본에서도 사나이의 눈물이 논란이다. 스스로를 ‘비정한 승부사’라고 주장했던 고위급 정치인이 눈물을 흘렸던 사실이 빌미가 돼 “비정한 승부사라고 할 수 없다.”고 유명 작가가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컷 우는 것은 건강에 좋다.”는 학설도 있다. 남자의 눈물. 굳이 참아야만 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춘규 도쿄특파원 taein@seoul.co.kr
2006-01-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