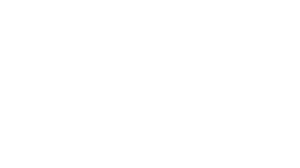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길섶에서]정류장에서/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5-01-10 00:00
입력 2005-01-10 00:00
모두 팔아도 몇 만원 될까 말까 한 고만고만한 노점상.30분 가까이 지켜봐도 값을 물어 보는 사람조차 없다. 한 할머니가 모닥불에 걸친 냄비에서 라면이 끓자 종이 박스에서 검은 비닐에 포장된 꾸러미 하나를 꺼낸다. 밥이다. 이미 꽁꽁 얼어 버린 밥을 숟가락으로 부수어 라면 위에 쏟아붓는다. 아무런 표정없이 숟가락질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도심 속 한겨울’을 떠올린다.
모두가 종종걸음으로 왔다가 황급히 떠나가는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하나 없이 몇 토막의 모닥불에 의지해 하루를 버텨 내는 할머니들의 잔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