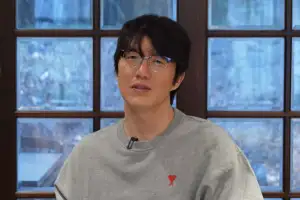[길섶에서] 고꼬리/심재억 문화부 차장
수정 2005-01-05 08:09
입력 2005-01-05 00:00
동무는 그것을 ‘고꼬리’라고 불렀는데, 그게 ‘고콜’이란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석유등잔이 보통인 시절에, 이건 완전히 원시인이다 싶어 마주 보고 히히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고꼬리’란 게 참 재밌었습니다. 연기가 밖으로 쏙쏙 빠져 설핏 번지는 송진내가 향기로웠고, 거기에 좀 어둡다 싶어 관솔 한 개를 더 얹으니 금세 화톳불처럼 불꽃이 일어 방안이 홍시빛으로 밝게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서울에서 고래등 같은 집도 장만하고 잘 삽니다. 얼마 전, 망년 모임에서 만난 그는 저의 ‘고꼬리’ 얘길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고생한 덕분에 밥이야 먹고 살지만, 그래도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요.‘그때’가 꼭 추억이라서 그리웠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좋아졌다지만 덕분에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심재억 문화부 차장 jeshim@seoul.co.kr
2005-01-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