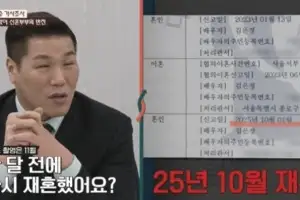[서울광장] 의결권의 두 잣대/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4-12-21 07:38
입력 2004-12-21 00:00

하지만 국민이 맡긴 자산인 연기금 의결권문제에서는 여권과 재계의 논리는 정반대로 바뀐다. 여권은 외국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연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와 한나라당은 정부가 연기금의 의결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여할 수 있다며 의결권을 금지하든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의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느냐며 재계를 면박하더니 연기금에서는 국민의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재계도 마찬가지다.
금융사를 운영하는 재벌이든, 연기금관리를 떠맡은 정부든 의결권 행사에 욕심을 앞세우기 전에 반드시 지키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감은 눈을 씻고봐도 찾을 수 없다. 서로 남의 돈으로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투다. 고객의 돈을 ‘눈먼 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결권 논란만 나오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연기금 사회주의’를 예견한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와 ‘연기금 자본주의’를 설파한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고든 클릭 교수를 들먹인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전제가 돼야 할 미국 연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못본 체 외면한다.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르렁거리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의 돈에 대한 무감각, 도덕적 해이는 역풍에 직면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연기금 동원 발상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연기금의 운용처 확대와 일정한 수익률 보장을 명분과 당근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보면 책임은 수익률 차액만큼만 지고 권한 행사는 동원하려는 연기금 수조원만큼 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지난해부터 환율방어를 위해 역외선물환(NDF) 거래에 손댔다가 1조 8000억원이나 날린 것도 사정은 비슷하다. 적은 부담으로 수십, 수백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투기상품에 손을 댔던 것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의 연기금 동원 발상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을 때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신뢰’라는 근본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과 재계는 타인의 피땀으로 일구어진 의결권에만 군침을 흘릴 게 아니라 먼저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의 눈금도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4-1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