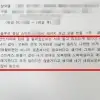[강유정의 영화 in] 처녀왕 엘리자베스의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수정 2007-11-17 00:00
입력 2007-11-17 00:00

때는 158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즉위한 이후, 유럽의 정세가 구교와 신교 사이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던 시기이다. 당시 세계의 권력은 무적함대를 내세운 스페인 필리페 2세의 손에 넘어가 있는 듯 보이고 신교를 믿고 있는 영국은 가톨릭교를 믿는 스페인의 은밀한 적으로 인식된다. 언제라도 ‘성전’을 치르기 위해 엘리자베스를 노려보는 필리페 왕, 영국 내 잔존하고 있는 구교와 신교의 충돌 등의 문제가 이 젊은 여왕을 고뇌로 이끈다.
중요한 것은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충돌 가운데 놓인 엘리자베스라기보다 자신의 여성성과 왕이라는 지위가 갖는 남성성을 두고 고민하는 인간 엘리자베스라는 사실이다. 밤새 쌓인 초겨울 첫눈처럼 달콤하고 순결한 엘리자베스, 그녀는 모든 남성들이 욕망하는 에로스의 대상이다.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있어 여성성은 거래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환심’을 사려 하지만 ‘진심’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환심을 향한 공작은 여왕의 처녀성에도 예외가 아니다. 주변국과 왕실의 각료들은 여왕의 처녀성을 활용해 정치적 게임에서 이익을 얻어내고자 한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은 거래이자 외교의 수단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좌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침실의 그녀가 자주 대조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왕좌에 앉은 그녀는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지만 치장을 벗고 드러낸 맨몸은 짧은 머리에 가냘픈 체중을 드러낸다. 왕좌와 왕위라는 복색이 그녀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영화가 처녀왕이었던 엘리자베스의 로맨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도 아마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욕망, 그것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 속 싶은 곳에 놓인 생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여왕은 짜증내고 변덕부리다가 상상하고 기대한다. 케이트 블란쳇의 훌륭한 연기 덕분에 히스테리컬한 처녀왕 엘리자베스는 역사적 위인이라기보다 흥미로운 캐릭터로 기억될 듯 싶다. 대규모 전투신을 주목하라고들 말하지만 시선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라일리 경의 키스 장면에 머문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 엘리자베스의 속깊은 사생활, 그것이야말로 영화가 누릴 수 있을 오만한 사치가 아닐까?
영화평론가
2007-11-1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