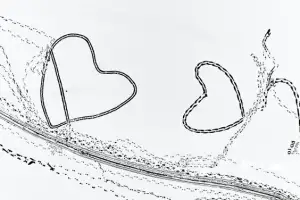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맛 에세이] 1인분의 한계
기자
수정 2003-06-04 00:00
입력 2003-06-04 00:00
그것은 정말 우리식 단순 계산이었습니다.저희 일행은 샐러드 바가 푸짐하기로 유명한 그곳에서 샐러드 바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그러자 종업원이 난색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이곳은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이므로 3명이 들어왔으면 3명 모두 주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양과 횟수 제한이 없으니 2인분을 시키고 3명이 먹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더군요.뷔페 식당에서 머릿수(?)를 세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그 사람의 식사량이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사람 하나는 1인분인 게 뷔페식 계산이니까요.
근데 앞 뒤 똑 떨어지는 그 계산법에 전 마음이 팍 상해버렸습니다.상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각자의 수저를 놀려 반찬들,심지어 찌개까지 공유하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식은 어디 갔나 싶어 화까지 났습니다.적어도 우리 음식문화에 이런 야박함은 없다고 혼자 분개했지요.
그러고 며칠 후,저는 우리 음식을 다루는 한식당에서도 이런 계산법이 통용된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동에서 산채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에서였습니다.이미 그 집의 명성을 알고 있는 저희는 선택의 여지없이 한 가지인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호리호리한 몸매의 중년 여인 세 분이 들어와서 앉아 주위를 둘러보더니 3인분을 시켜먹으면 음식이 많이 남겠다고 그네들끼리 합의를 보는 듯했습니다.막상 주문을 하자 종업원은 볼멘 소리로 그렇게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며 원치 않으면 나가도 괜찮다고 굉장히 배려를 하는 듯이 말하더군요.한참의 실랑이 후,그네들은 어쩔 수 없이 3인분을 시켰지만 나중에 보니 역시 손님들 예상대로 음식은 남고 또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머릿수를 세어야겠지요.가정집도 아니고 숟가락 하나 놓는 일은 손님 한 명을 맞는 일과 똑같은 일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손님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1인당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2.5인상,3.5인상 등이 있으면 지금보다 경비와 재료비를 줄이는 일이 될 테니까요.
신 혜 연 월간 favor 편집장
2003-06-0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