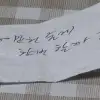[김영두의 그린에세이] 장타의 설움
기자
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나는 그렇게 짐승 같은 샷을 날리는 아마추어 골퍼도 보았다.골프동호회에서 만난 S는 인간 이상이었다.그는 무지막지한 괴력으로 ‘복날 땡칠이 패듯’ 공을 두들겨 팬다.잘 맞은 공은 거리를 잴 수 없을 만큼 날고,빗맞은 공이 떨어질 주소는 공에게 물어봐야 한다.내리막 경사의 360m 파4홀에서 그가 드라이버로 친 공을 그린 뒤쪽의 수풀에서 찾아낸 적도 있다.
그의 제1타가 왼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버렸다.공의 궤적을 쫓던 그는 “집 나간 여편네와 OB지역으로 도망간 공은 찾지 말라.”는 성자의 말씀을 기억해 내고,슬프지만 공과의 작별인사를 했다.별수 없이 제3타를 치고 힘없이 페어웨이로 내려서서 우울하게 걷던 그는 숲 속에서 홀연히 나타난 한 노인을 보았다.노인은 곧장 S에게로 다가왔다.
“이것이 젊은이 공인가?” 표피가 찢기긴 했지만 분명 S의 공이었다.
“맞습니다.근데…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주차장에서 막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공이 날아왔지.이 공이 내 차의 유리창을 박살냈네.”
“그럼 저는 어떡해야 하죠?”
“몰라서 물어? 테이크 백에서 클럽의 토는 하늘을 향해야 하는데 정면을 향하면서 엎어져 있었던 거야.그래서 훅이 났지.그러니까 토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립을 고쳐 잡아야 해.왼손에 칼을 잡고 있는 무사를 연상해봐.왼손으로 칼을 잡듯 클럽을들고서 가볍게 쳐야지.알겠나?”
소설가·골프칼럼니스트 youngdoo@youngdoo.com
2003-05-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