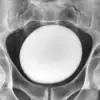[데스크 시각] 週 14회와 3회의 차이
기자
수정 2003-05-02 00:00
입력 2003-05-02 00:00
YS정부 시절 박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는 이원종씨다.정무수석 재임 당시 이씨는 폭탄주를 들면서도 저녁 8시,9시 TV뉴스를 챙겼다.핸드TV를 보면서 식사하기도 했다.
박지원·이원종씨는 국정 전반에 대해 영향력이 막강했었다.식사약속으로만 따지자면,관심의 3분의2는 언론에 쏠려있었던 셈이다.
두 사람이 언론에 집착했던 이유는 간단했다.DJ·YS 모두가 언론보도에 그만큼 민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거리를 두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언론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생각 같다.전임 정부 실력자들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 다분히 느껴진다.
“부장은 좋은 시절 기자했는데,우리만 손해 보네요.” 부원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다.크게 ‘대접’받았다는 생각은 없지만,후배들을 불편하게 만들 빌미를 새 정권 담당자에게 준 적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부원들에게 묻기도 했다.다행히 현재까지는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반응이다.정당 출입 기자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부처 출입은 앞으로 브리핑룸이 만들어지고,사무실 방문이 금지되면 취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정도였다.
다만 비서실 취재를 제한당하고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다.그러나 인간만큼 적응이 빠른 창조물이 또 있겠는가.나름대로 취재 노하우를 개척해 가고 있었다.취재공간을 브리핑룸으로 제한한 데 불편한 쪽은 기자만이 아니다.청와대 보좌진들도 마찬가지다.
‘기자 기피’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청와대 당국자는 유인태 정무수석이다.‘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취중 진담이 기사화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술이 오르면 상욕을 섞어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한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이해성홍보수석도 취임초에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기자들과 만남이 뜸했다.요즘 들어서는 달라졌다는 평가다.유 수석이나 이 수석이 언론인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횟수는 주당 3∼4회 정도라고 한다.
이쯤 해서 한번 따져보자.주당 14회와 3회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적어도 나와 같이 일하는 일선기자들은 당국자들과 밥을 열번을 먹건,한번도 안 먹건 그것 때문에 기사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기자들에게 가장 잘해주려 했던 정권은 노태우 정부였다.그럼에도 당시 기자들이 특별히 기사를 잘 써주려고 했던 기억은 없다.
현장 기자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소주 사주면 딜(Deal)이 된다.”는 식의 폄하다.기자들이 취재원과 자꾸 만나려는 것은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다.당국자들도 현상을 정확히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민정수석이 기자들의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준다고 한다.고무적인 현상이다.굳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좋다.‘의사소통로’만 확실히 열려 있다면 불필요한 긴장관계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 목 희 정치부장
2003-05-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